반가움이자 감사함이었다. 22세에 등단했던 시인이 어느덧 쉰이 넘어서 '다시' 시인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정말이지 반갑고 감사했다.
첫 시집인 1992년 <친구여 찬비 내리는 초겨울 새벽은 슬프다> 이후 27년 만인 2019년 2번째 시집 <꽃도 사람처럼 선 채로 살아간다>(문학의 숲)로 돌아온 채광석 시인. 시집을 넘기는 내내, 20대를 지나 30대와 40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시인으로 살고 싶었을까 짐작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다.
시집 첫머리, '시인의 말'은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한다.
살아왔고 살아갈 날이 / 하루하루 죄를 쌓아 올리는 거대한 돌탑 같다. / (중략) / 이 시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/ 나와 우리 세대의 그림자에게 바친다.
죄, 두려운, 그림자…. 시집 첫 장부터 접한 무거운 단어들은 시집을 덮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온다.
큰사진보기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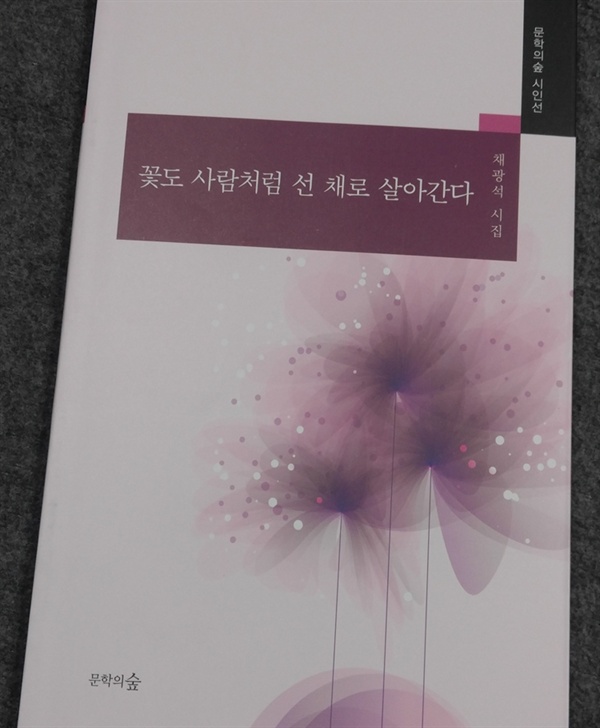
|
| ▲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시인으로 돌아온 채광석의 시집 <꽃도 사람처럼 선 채로 살아간다> |
| ⓒ 최육상 | 관련사진보기 |
둘째가 태어났고 / 때마침 한 출판사로부터 / 끝내 출간되지 못한 / 시집 원고도 되돌아왔다 / 이유가 두 가지나 늘었다 / 돈을 벌기로. / 스물아홉이 되니 / 왕성한 물욕이 일었다(<1997 절필> 전문)
시인으로 살고자 하던 욕망(?)은 시인이 고백했듯이 물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. 시집을 접하며 떠오른 '얼마나 시인으로 살고 싶었을까'라는 짐작은 짐작이 아닌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.
(전략) 사월 봄날 / IMF 한가운데 학원 하나를 차렸다 / 주변에서는 시나 쓰지 무슨 장사일이냐며 / 한목소리로 만류했지만 / 첫째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(후략)(<서른1 독립선언> 중에서)
'시나 쓰지'라는 주변의 권유는 시인에게는 차라리 지독한 아픔이었을 터. 그러나 아픔만큼 컸을 시를 향한 간절함 역시 솔직하게 보여준다.
내가 아는 한 동생은 / 스무 살부터 죽어라 시만 썼고 / 스물일곱 되던 해 중앙일간지 신춘문예로 / 봄날 화관처럼 얼굴 디밀었지만 / 무슨 까닭인지 / 그 뒤로 시는 안 쓰고 돈만 빌려달랬다 / (중략) / 형님 나 결혼도 하고 애도 생겼으니 이제 가우. / (중략) / 봄 산행에서 만난 어느 꽃바람을 잘못 쏘였는지 / 번역사로 살고 있다는 그에게 / 문득 안부 전화를 하게 되었다 / 형님 나 문학병 도지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니 / 다신 서로 연락하지 맙시다. / 한 이십여 년 시 안 쓰다가 / 이제 시나 쓰며 살아보자 꼬드긴 / 나도 참 가벼운 개새끼였다 (<무늬10 돌아오지 못한 시> 전문)
"형님 나 문학병 도지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니 다신 서로 연락하지 맙시다"는 채광석 시인이 시인으로 돌아오기까지 왜 27년이 걸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? 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,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 멀고도 멀었을 거리.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'화려한 휴가'를 빗댔을 것 같은 <서른4 화려한 불안>에서는 물욕을 택했던 시인의 깊은 고뇌가 드러낸다.
열심히 일했다 / 화려한 차를 몰았고 / 화려한 호텔에서 밥을 먹었으며 / 화려한 침대에서 자기도 했다 / 이제는 시인이라 기억해주는 /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/ 다들 학원 이사장이라 불렀다 / 몇몇 신문사에서는 / 사교육 시장을 접수한 386 운동권이란 /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/ 내 이름도 포함되었다 / 무언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/ 다가오고 있었다 / 시대의 중심에서 비껴선 / 변방의 일상은 화려했지만 / 화려함이 어떤 불안 속에서 뒤척였다 / 몇몇 학원 원장들도 / 나랑 비슷한 생각이었다 (<서른4 화려한 불안> 전문)
'대학 재학 중 등단'이라는 수사는 화려함 그 자체다. 하지만 등단은 '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'과는 화려함의 결이 전혀 다르다.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에 절필을 하고 줄곧 고뇌했을 시인의 화려한 아픔은 <산초 냄새>를 타고서도 진하게 전해진다.
먹고 사느라 스무 해 넘도록 / 시를 쓰지 않았다 / 먹고 사느라 서른 해 넘도록 글만 짓고 살았다는 한 문형(文兄)을 / 여름비 내리는 정동극장 앞에서 만났다 / 근처 허름한 추어탕 집에서 / 허기를 먼저 채우기로 하였는데 / 흙냄새 비릿한 추어향보다 / 그의 문향이 먼저 코를 찔렀다 / 저절로 주눅이 드는 건 / 내 몸에 배인 / 잡인의 냄새 때문이었을 게다 / 산초만 자꾸 치는 내게 / 그가 웃으며 말했다 / 아우, 너무 많이 치면 안 좋다네. / 밥집을 빠져나와 / 비에 젖은 정동 길을 좀 걸었는데 / 흰 자작나무 밑 그가 담배 한 대를 권하며 / 자작나무처럼 웃더니 / 이제라도 시 짓고 사세나, 했다 / 여름비에서는 자꾸 산초 냄새가 났다 (<산초 냄새> 전문)
시집은 제1부 90 그리고 서른, 제2부 마흔, 무늬 몇 개, 제3부 쉰 즈음, 제4부 역사의 바깥 등 총4부로 구성돼 있다. 1,2,3부는 시인의 나이 먹어감에 따라 시간이 흘러간다. 그러나 시집 전체를 통틀어 등장하는 '시나 쓰지', '문학병', '시 짓고 사세나' 등 시를 향한 간절함은 현실에서 이상으로 거슬러 오르는 느낌이다.
꽃도 / 사람처럼 / 선 채로 살아간다는 걸 / 먼저 서고 나서야 / 편다는 걸 / 까마득한 옛날부터 / 그래왔다는 걸 / 이제야 / 안다 / 그까짓 화관(花冠)이 대체 무어라고 / 어느 봄 한 날 / 눈물겨워라 / 시간을 모아 / 제 허리를 만들고 / 시간을 세워 / 우주 한 장 밀어 올리는 / 저 / 공력이(<무늬1 꽃도 사람처럼> 전문)
시집의 제목이 된 이 시는 20대에 화관을 쓰고 등단한 뒤 생업의 전선을 돌고 돌아 다시 시인으로 선 자신에게 들려주는 독백일 듯싶다. 시집은 1968년생으로서 60년대생, 80년대학번, 5십대 나이에 접어든 '586세대'로 불리는 시인이 그러했듯 시대를 함께 아파하며 시대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묵직한 고뇌와 성찰로 가득 차 있다.
나의 대학생 시절 학과 선배로서 이름만 들었었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갑고 감사했던 채광석 시인에게 다시 시인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어린 인사를 올린다.
큰사진보기

|
| ▲ 1992년 채광석 시인의 첫 시집 <친구여 찬비 내리는 초겨울 새벽은 슬프다>. 나 역시 27년 만에 책장에서 꺼냈다. |
| ⓒ 최육상 | 관련사진보기 |